[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자녀 출산을 이유로,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 2. 24.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1) 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을 도과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2) 에 3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 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에게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는 제척기간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조항은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과 관련된 입법논의를 보면, 위 법률 개정은 조문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는 취지의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이후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권’은 서로 구분된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결정을 하여 발생한 구체적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각 조문이 중첩되어 서로 충돌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 조항의 경우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을 통해 ‘제척기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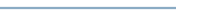
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07조(소멸시효) 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